V. 맺음말
유주와 영주의 위치를 밝히기 위해 최초의 구주설인 <상서/우공>, <여씨춘추/유시람>, 그리고 <회남자/지형훈>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이들 1차사료와 문헌자료들에서 기주(冀州)는 황하 동쪽의 의미인 하동(河東)으로 경도 110도와 위도 35도로 경계한 황하강의 양쪽사이를 지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주(幽州)란 명칭이 처음 나타난 것은 전국시대에 지어진 <여씨춘추>로 “북방으로 유주이며 연(燕: 북연)국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연국의 위치가 산서성 남부와 황하북부 하남성 별칭 하내(河內)임을 사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영주는 두 곳으로 ‘영주A’와 ‘영주B’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영주에 관한 기록은 <태평환우기>, <흠정성경통지>, <명일통지>, <문헌통고>, <기보통지> 등으로 이들 모두 “은나라 시기 고죽국의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죽국의 위치가 요서이자 유주이며 기주인 산서성 남서부임을 <한서/지리지>, <후한서>, <설문해자>, <사기정의>, 그리고 <통전>의 기록을 인용하여 밝히고 그림으로도 설명하였다.
이들 문헌사료들이 언급하고 있는 영주는 산서성 남서부의 영주로 후위시기 설치한 섬서성 서안 동부와 서로 겹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영주B’는 하남성 하내의 광녕 동쪽으로 순임금이 12주를 만들 때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영주A’ 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앞서 만들어진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1차사료와 문헌자료들에 의하면 유주와 영주는 기주지역과 겹치는 지역으로 넓게는 섬서성 동북부, 하남성 서북부, 그리고 산서성 남부 일대로 황하강 주위의 지역을 뜻하였고 좁은 의미로는 산서성 남서부를 지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좁은 의미의 유주와 영주 그리고 기주의 위치에 집중하였다.
산서성남부와 황하북부 하남성 일명 하내를 기주라 하였으며 동시에 황하북부의 의미로 하북(河北)이라 하였음도 사료와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당시 기주이고 유주이자 요서인 산서성 남서부에 있던 노룡(새), 수양산, 유수(난하), 고죽국, 포판, 창려 등이 오늘날의 하북성으로 옮겨진 의혹과 개연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의 상징적인 자연지형인 수양산(首陽山)이 오늘날의 중조산(中條山)이라는 사실을 당나라 지리서인 <원화군현도지>를 통하여 명확히 밝혔다.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주와 영주는 황하강 주변의 지역이라는 중요한 사실의 확인이다. 오늘날의 하북성은 황하의 주변 지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하북성에 있다는 수양산은 중조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북성이 유주와 영주라는 오류는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필자가 1차사료와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밝힌 유주, 요서, 영주 그리고 기주의 위치가 황하와 인접한 산서성 남서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한국역사학계는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작은 연구가 밑거름이 되어 왜곡으로 점철되어온 동이배달한민족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많은 훌륭한 학자들의 폭넓은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coreanhistory.com 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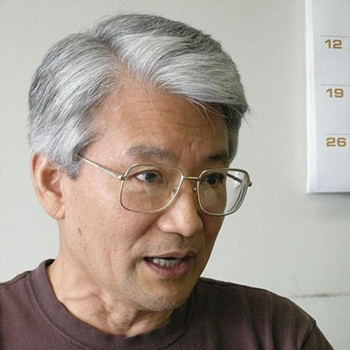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영의 한민족참역사’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cpk

